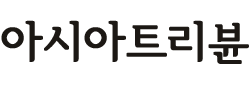종합Home > 종합 > 교육
-
서울대 정유성 교수팀 신소재 재설계 관련 AI 기반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정유성 교수팀이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해 기존에 합성이 어려웠던 신소재를 실제로 합성 가능한 형태로 다시 설계하는 혁신적 AI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 단순히 물질의 합성 가능성(synthesizability)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성이 어려운 신소재를 재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반도체 신소재나 고효율 배터리 소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첨단 소재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최재환 석박사통합과정생과 김성민 박사후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성과는 화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JACS)에 게재됐다. 계산화학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론적으로 유망한 물질 후보를 대량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실험실에서 그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물질의 합성 가능성 예측에 집중해온 반면, 합성이 어렵다고 판정된 물질을 어떻게 합성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는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새로운 LLM 기반 프레임워크인 ‘SynCry’를 개발했다. 이 모델은 신소재의 결정 구조 정보를 역변환 가능한 텍스트로 표현하고, 반복적 미세조정(iterative fine-tuning)을 통해 합성이 어려운 구조를 합성 가능한 구조로 변환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한다. 연구 결과 SynCry는 초기 514개의 성공적 구조 변환에서 출발해 반복적 미세조정을 통해 총 3395개의 구조를 합성 가능한 형태로 재설계하는 데 성공했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재설계된 상위 100개 구조 중 34개가 학습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실제 문헌에서 실험적으로 합성이 보고된 물질과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SynCry가 단순 학습 데이터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합성이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설계 기술은 ‘학습 후 재생성(learn-and-regenerate)’ 전략을 통해 LLM이 단순 예측을 넘어 실질적인 신소재 설계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첨단 소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기존에 합성이 어려워 제외됐던 수많은 후보 물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유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가 합성이 어려운 구조에서 출발해 신소재를 직접 재설계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향후 더 다양한 소재 시스템과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확장해 실용적 신소재 발굴 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합성이 어렵다고 판단돼 버려지던 가상물질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연구”라며 “앞으로 언어모델을 포함한 범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신소재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LLM 기반 합성 가능성 예측 연구를 수행해 온 김성민 박사후연구원은 “이번 성과는 AI가 소재과학에서 창의적 설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앞으로 LLM을 포함한 범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무기 소재의 합성 메커니즘 규명 및 최적 합성 경로 도출을 자동화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김성민 박사후 연구원은 앞으로 신소재 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기계학습과 재료과학을 융합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한국항공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와 계약학과 신설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및 협의체 8개사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여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 공사 3개 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국제공항보안,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및 유관업체(한국면세점협회, 네스트호텔, 인스파이어리조트)다. 교육비는 참여기관이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임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학과 운영과 교육과정은 공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해 한국항공대와 협의체 참여기관이 함께 설계한다. 한국항공대는 공항 운영·안전·정책·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각 기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국내에서 처음 설치되는 항공관리학과 대학원 과정은 항공안전, 교통물류, 항공경영 등 전공별로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을 이끌 리더와 전문가 양성의 허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학과 학위과정은 공항 종사자들의 직무 역량 향상과 더불어 참여기관 간 상생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52년 개교한 한국항공대학교(KOREA AEROSPACE UNIVERSITY)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우주 종합대학이다. 항공기와 인공위성의 제작과 설계, 정비(MRO),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의 공학부터 운항, 항공교통관제, 물류,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항공우주 전 분야를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다.
-
서울대 안성훈 교수팀, 전자회로 없이 특정 주파수 증폭 가능한 필터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기계공학부 안성훈 교수 연구팀이 전자회로 없이도 특정 주파수를 걸러내고 증폭할 수 있는 ‘음향 밴드패스 필터(Interference Acoustic Filter)’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마이크 하나와 간섭 기반 메타구조를 활용해 원하는 주파수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고소음 환경에서도 기계 고장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계공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 ‘메카니컬 시스템즈 앤 시그널 프로세싱(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에 이번 달 게재됐다. 공장, 발전소, 항공기 엔진룸과 같은 산업 현장은 80~100데시벨(dB)에 달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계가 고장 나기 직전 내는 미세한 ‘이상 신호음’이 거대한 기계 소음에 묻혀버려 작은 균열이나 기계 마모 같은 초기 징후를 놓치기 쉬웠다. 이는 결국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와 막대한 수리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산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음 환경에서 ‘소리’로 기계 고장을 진단하는 기술이 등장했다. 기계가 정상일 때와 고장 났을 때 내는 소리(주파수)가 다른 점에 착안해 고장을 의미하는 특정한 ‘이상 주파수’ 성분만 정확히 분리해 기계 이상을 진단하는 원리가 적용된 방식이다. 따라서 이 기술에는 기계 내외부에 장착된 전자회로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센서 신호에서 특정 주파수를 분리하는 ‘밴드패스 필터’와 복잡한 마이크 배열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방식에는 계산량이 많고,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 고장(다른 주파수)을 진단하기 위해 매번 번거롭게 비싼 회로나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성훈 교수 연구팀은 복잡한 전자식 필터나 다중의 마이크 배열 없이 피리 모양의 세계 최소형 메타구조(직경 4cm·길이 30cm)와 마이크 하나만으로 1.8~22킬로헤르츠(kHz) 대역의 소리를 선별·증폭하는 하드웨어 밴드패스 필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소리를 간섭시키는 구조만으로도 주파수를 걸러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 발상의 구현에 나선 연구진은 실린더 형태의 ‘간섭 원리 기반 메타구조(Interference Structure)’를 고안하고, 그 안에 일정 간격으로 뚫린 여러 개의 슬릿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가 서로를 상쇄·보강하도록 설계했다. 그에 따라 이 밴드패스 필터는 기존의 전자신호 대신 음파의 위상 차이를 이용해 특정 방향의 특정 주파수를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조를 돌려 각도만 바꿔도 어떤 주파수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달라지므로(예: 2kHz → 71°, 5kHz → 20°, 10kHz → 11°) 장치를 물리적으로 회전시켜 원하는 주파수의 소리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고안된 밴드패스 필터는 이전 방식과 달리 새로운 종류의 기계 고장(다른 주파수)을 탐지할 때마다 매번 새 구조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 즉, 다양한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탐지해야 하는 산업 현장에서 범용성이 부족했던 기존 밴드패스의 한계를 극복한, 하드웨어로 작동하는 음향 밴드패스 필터가 구현된 것이다. 연구진은 밴드패스 필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현장 실험에서 공사장 소음, 클럽 음악, 기차 소리와 유사한 크기의 100dB 소음 조건에서도 목표 주파수의 신호 세기가 4.82배 커지는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가공 기계에 적용한 실험에서는 고장을 뜻하는 이상 주파수(2041Hz)가 19.9배 증폭해 새로 개발한 밴드패스 필터의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다. 또 기존의 소리 센서로 취득한 데이터로 훈련시킨 인공지능(AI) 고장 진단 모델은 소음 환경에서의 기계 고장 인식률이 0%에 그쳤으나 음향 밴드패스 필터 센서로 취득한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은 동일한 환경에서 78.6%의 인식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기존에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했던 고장이 앞으로는 정밀하게 진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연구진은 단순한 하드웨어 구조 하나의 기능이 복잡한 전자식 필터나 다중 마이크 배열이 맡던 역할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실증했다. 이번 연구의 밑바탕인 ‘간섭 원리 기반 메타구조’ 설계는 연구진이 이전에 개발한 ‘단일센서 기반 3차원 위치추정(3DAR, 3D Acoustic Ranging)’ 기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안 교수팀은 해당 연구에서도 메타구조를 활용해 마이크 하나와 회전 구조만으로 소리의 위치를 추정하는 혁신적 음향 센서를 구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원리를 한 단계 더 확장해 소리를 ‘듣는’ 걸 넘어 ‘선택적으로 걸러내는’ 단계까지 발전시킨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 기술은 앞으로 스마트 공장, 로봇, 항공기, 풍력 터빈 등 고소음 산업 환경에서 안전 사고의 징후인 주요 이상 신호를 잡아내는 하드웨어로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장 내 CNC나 모터의 이상 소리만 자동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24시간 계속되는 소음 속에서도 센서가 배관 누수나 충돌음을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오직 하드웨어만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없고, 고장 위험이 낮으며, 유지 비용이 적다는 강점도 향후 음향 밴드패스 필터가 폭넓게 응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안성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회로가 계산하기 전에 기계가 먼저 판단하는 지능, 즉 물리적 지식 기반 구조가 정보를 선별·가공해 연산 부담을 줄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지능(Mechano-Intelligence)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논문의 제1저자인 안세민 박사과정생은 “세계 최초로 선보인 하드웨어 음향 필터는 각도만으로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으며, 향후 AI와 결합 시 소음 속에서도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기계의 지능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세민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생은 혁신설계 및 통합생산 연구실에서 인간처럼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인지/판단/행동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다중 로봇의 협업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부가 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RS-2024-00409092)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
서울대 이건도 교수팀 ‘열적 디커플링’으로 고온초전도 현상 매커니즘 규명
서울대학교 고온초전도 연구단(단장 이건도 신소재공동연구소 연구교수)이 4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던 고온초전도 현상의 근본 원인을 ‘열적 디커플링(Thermal Decoupl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자 중심 이론으로는 해석되지 않던 여러 실험 결과를 모두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이번 연구는 초전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물리 분야의 국제학술지 ‘머티리얼즈 투데이 피직스(Materials Today Physics, IF=9.7)’에 ‘Thermal Decoupling in High-Tc Cuprate Superconductors’ 제하의 논문으로 지난 10월 27일 온라인 게재됐다. 1911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카멜링 오네스가 발견한 ‘초전도 현상’은 전류가 저항 없이 흐르는 상태다. 이후 1957년 ‘BCS(Bardeen·Cooper·Schrieffer) 이론’을 발표해 초전도 현상의 메커니즘을 밝힌 미국의 물리학자 바딘·쿠퍼·슈리퍼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지만, 이 이론은 섭씨 약 영하 250도(절대온도 약 25K) 이하에서만 성립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86년 IBM취리히연구소의 베드노르츠와 뮐러가 영하 240도에서도 초전도체가 되는 구리산화물(cuprate)을 발견한 뒤 상압·영하 140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발견된다. 따라서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은 ‘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가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오래 매달려왔다. 지난 40년 동안 많은 접근법이 실패한 건 ‘전자’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파악한 서울대 이건도 교수팀은 층상 구조를 가진 고온 초전도체의 열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로 이 난제의 해결에 도전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고온 초전도 물질은 이차원 물질이 적층된 구조며, 각 층이 서로 다른 원소로 이뤄져 층간 결합이 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섭씨 영하 70도(절대 온도 약 200K) 이하일 때 층 사이의 열 흐름이 끊어지는 ‘열 분리(thermal decoupling)’ 현상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초전도가 실제로 일어나는 구리와 산소로 이뤄진 층은 YBCO(Yttrium barium copper oxide, 이트륨 바륨 구리 산화물로 이뤄진 고온 초전도 물질) 내부에 있고 낮은 유효온도를 유지하며 BCS 이론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실험에서 측정되는 값은 바륨과 산소로 이뤄진 표면층의 높은 온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간의 실험 결과가 기존 이론과 불일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효온도 차이를 만든 핵심 요인은 바륨(Ba)과 같은 알칼리 토금속으로, 이들이 층간 이온 결합을 조절하며 열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규명됐다. 아울러 이론적 계산에 따르면 이 ‘온도 분리 효과’를 보정했을 때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던 저항과 온도의 선형관계(linear-T resistivity), 우에무라 관계(Uemura relation), 초전도 돔(superconducting dome), 축소된 동위원소 효과(isotope effect)가 모두 하나의 원리 하에 정량적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고온초전도 메커니즘 규명에 성공한 이번 연구는 반도체 중심의 기존 전자 산업을 뛰어넘는 혁신적 산업, 즉 양자소자, 전력전송, 양자 컴퓨팅, 자기부상, 에너지 저장 기술 등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상온에 근접한 초전도체 개발의 핵심 아이디어를 확보해 관련 특허를 이미 출원했으며, 머신러닝 기반의 고온 초전도 신물질 탐색 연구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이건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열평형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 패러다임으로, 과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플랑크의 양자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곧 ‘열적 디커플링’을 직접 검증하는 실험 결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의 주저자로서 핵심 계산을 수행한 서울대 신소재공동연구소의 이성우 박사는 마법각도 꼬임 이중층 그래핀, 카고메 초전도 물질 등 다른 고온 초전도 물질에서도 ‘열적 디커플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 난제도전과제 및 KISTI 슈퍼컴퓨팅 센터의 거대도전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
아태이론물리센터 전재형 사무총장, 경북과학기술대상 과학기술진흥 부문 대상 수상
아태이론물리센터(소장 사사키 미사오, 이하 APCTP)는 ‘2025 경북과학기술대상’ 과학기술진흥 부문 대상 수상자로 전재형 사무총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북과학기술대상은 과학기술의 육성과 그 문화 확산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상으로, 창의적인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2001년 제정됐다. 수상자는 부문별 성과, 우수성, 그리고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전재형 사무총장은 물리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2021년 APCTP 사무총장으로 부임해 △정부 공공사업 우수 운영을 통한 지역 과학행정 위상 제고 △APEC 기반 국제협력 확대 및 과학외교 실현 △과학문화 대중화 및 지역 인재 양성 기반 확립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5 경북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경북과학축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과학축전은 경상북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과학문화 축제로 다양한 전시·체험·강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APCTP는 경북과학축전과 연계해 경북도민들을 대상으로 ‘APCTP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강연’을 양일간 진행 예정이다. APCTP 사사키 미사오 소장은 “센터는 국내외 연구 활동과 국제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는 것 같다. 앞으로도 센터는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북도민을 위한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PCTP는 199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내 유일의 국제이론물리센터다. 현재 아태 지역 19개 회원국 및 36개 협력·협정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여 명의 국내외 과학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해 왔다.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연구 협력 확대를 이어가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론물리 및 기초과학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발히 촉진하고 있다. 또한 대중강연, 지역 과학축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시민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과학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있다.
-
서울대 권성훈 교수팀, 신속 무균 시험법 개발 성공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서울공대)은 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과 이은주 교수,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김태현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기존에는 14일이 걸리던 의약품 무균 검사를 단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는 ‘신속 무균 시험법(NEST, Nanoparticle-based Enrichment and rapid Sterility Test)’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게재됐다. 대한약전에 따른 무균시험법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균이 없어야 하는 제품이 실제로 무균 상태인지 확인하는 시험법으로, 일반적으로 14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최근 제약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의 바이오의약품에도 이와 동일한 확인 시험법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은 현대 생명공학의 산물로, 난치 혈액암 환자를 완치시킨 CAR-T 세포치료제, 팬데믹의 흐름을 바꾼 코로나19 mRNA 백신, 그리고 암 면역치료의 핵심 무기가 된 단일클론항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약품들은 불치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암을 완치시키고 치료 기회가 없던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연 바 있다. 이처럼 미래 의료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4000억달러(약 55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매년 약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빠른 시장 성장 및 기술 진보와는 대조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과거 합성의약품의 기준을 답습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 기준은 유효 기간이 수일에 불과한 최신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를 낳는다. 바이오의약품의 무균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약효는 사라지고 환자는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의약품의 무균 입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투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했던 한계였다.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선 공동 연구진은 기존 검사에 소요됐던 14일의 기간을 단 하루 이내로 단축한 신속 무균 검사 기술인 NEST를 개발했다. 환자에게 무균이 입증된 바이오의약품을 제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연구진은 우리 몸의 선천 면역 반응(침입균을 구별하는 방어 체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다양한 병원균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특수 펩타이드 코팅 자성 나노입자를 활용해 의약품 내 극미량의 병원균을 신속히 농축했다. 이어 광범위한 미생물의 대사 신호를 실시간으로 고감도 형광 검출할 수 있는 전용 이미징 칩과 자동화 장비를 개발해 기존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와 높은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8시간 이내에, 14가지 균종에서 극미량의 균(1ml당 하나의 균체)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공동 연구진은 임상 등급의 줄기세포와 1회 투여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CAR-T 세포치료제 등 실제 투여용 샘플을 활용해 검증을 수행했고, 그 결과 NEST가 실험실 단계를 넘어 실제 환자 시료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과 이은주 교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제조 직후 환자에게 즉시 투여되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완제에 대한 14일 무균 검증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완제에 대해서도 당일 무균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된다면, 관련 규제 체계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이며 환자 안전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훈 교수가 대표로 있는 종합 미생물 진단 기업 퀀타매트릭스와 서울대학교병원은 NEST의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 8월 신속 무균 검증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규모 임상 검증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용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자체 생산·운영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제 환자 시료 기반 평가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퀀타매트릭스는 서울대·고려대·서울대병원 연구진과 ‘uRAST(세계 최초로 배양 없이 13시간 이내 항생제 감수성·병원체 동정, 2024년 Nature 게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 미생물 진단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NEST의 장비·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적용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올해 안에 서울대병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 내에 장비 2대를 설치하고, 실제 임상 시료로 성능 평가와 기술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바이오의약품을 넘어 패혈증 진단, 식품 안전성 검사, 화장품 무균성 검증, 감염병 확산 초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 김태현 교수는 “NEST는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여러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임상 현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신뢰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ᅠ 서울대 권성훈 교수는 “이번 성과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가 검증과 임상 적용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향후 국내를 넘어 글로벌 임상과 규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ᅠ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강준원 박사는 2025년 2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혈액 배양 단계를 생략한 패혈증 진단 플랫폼과 의약품의 신속 무균 입증 플랫폼 등 혁신적인 균 검출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산업체 및 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해당 기술들의 임상 적용성과 산업적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하는 동시에 신생아 패혈증 진단 및 환경 모니터링, 폐렴 모사 시스템 등 감염성 질환의 진단 및 관리 분야로 연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
-
서울대 정유성 교수팀 신소재 재설계 관련 AI 기반 기술 개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정유성 교수팀이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해 기존에 합성이 어려웠던 신소재를 실제로 합성 가능한 형태로 다시 설계하는 혁신적 AI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 단순히 물질의 합성 가능성(synthesizability)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성이 어려운 신소재를 재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반도체 신소재나 고효율 배터리 소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첨단 소재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최재환 석박사통합과정생과 김성민 박사후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성과는 화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JACS)에 게재됐다. 계산화학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론적으로 유망한 물질 후보를 대량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실험실에서 그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물질의 합성 가능성 예측에 집중해온 반면, 합성이 어렵다고 판정된 물질을 어떻게 합성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는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새로운 LLM 기반 프레임워크인 ‘SynCry’를 개발했다. 이 모델은 신소재의 결정 구조 정보를 역변환 가능한 텍스트로 표현하고, 반복적 미세조정(iterative fine-tuning)을 통해 합성이 어려운 구조를 합성 가능한 구조로 변환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한다. 연구 결과 SynCry는 초기 514개의 성공적 구조 변환에서 출발해 반복적 미세조정을 통해 총 3395개의 구조를 합성 가능한 형태로 재설계하는 데 성공했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재설계된 상위 100개 구조 중 34개가 학습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실제 문헌에서 실험적으로 합성이 보고된 물질과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SynCry가 단순 학습 데이터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합성이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설계 기술은 ‘학습 후 재생성(learn-and-regenerate)’ 전략을 통해 LLM이 단순 예측을 넘어 실질적인 신소재 설계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첨단 소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기존에 합성이 어려워 제외됐던 수많은 후보 물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유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가 합성이 어려운 구조에서 출발해 신소재를 직접 재설계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향후 더 다양한 소재 시스템과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확장해 실용적 신소재 발굴 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합성이 어렵다고 판단돼 버려지던 가상물질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연구”라며 “앞으로 언어모델을 포함한 범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신소재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LLM 기반 합성 가능성 예측 연구를 수행해 온 김성민 박사후연구원은 “이번 성과는 AI가 소재과학에서 창의적 설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앞으로 LLM을 포함한 범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무기 소재의 합성 메커니즘 규명 및 최적 합성 경로 도출을 자동화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김성민 박사후 연구원은 앞으로 신소재 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기계학습과 재료과학을 융합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 종합
- 교육
-
서울대 정유성 교수팀 신소재 재설계 관련 AI 기반 기술 개발
-
-
한국항공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와 계약학과 신설
-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및 협의체 8개사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여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 공사 3개 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국제공항보안,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및 유관업체(한국면세점협회, 네스트호텔, 인스파이어리조트)다. 교육비는 참여기관이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임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학과 운영과 교육과정은 공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해 한국항공대와 협의체 참여기관이 함께 설계한다. 한국항공대는 공항 운영·안전·정책·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각 기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국내에서 처음 설치되는 항공관리학과 대학원 과정은 항공안전, 교통물류, 항공경영 등 전공별로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을 이끌 리더와 전문가 양성의 허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학과 학위과정은 공항 종사자들의 직무 역량 향상과 더불어 참여기관 간 상생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52년 개교한 한국항공대학교(KOREA AEROSPACE UNIVERSITY)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우주 종합대학이다. 항공기와 인공위성의 제작과 설계, 정비(MRO),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의 공학부터 운항, 항공교통관제, 물류,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항공우주 전 분야를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다.
-
- 종합
- 교육
-
한국항공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와 계약학과 신설
-
-
서울대 안성훈 교수팀, 전자회로 없이 특정 주파수 증폭 가능한 필터 개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기계공학부 안성훈 교수 연구팀이 전자회로 없이도 특정 주파수를 걸러내고 증폭할 수 있는 ‘음향 밴드패스 필터(Interference Acoustic Filter)’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마이크 하나와 간섭 기반 메타구조를 활용해 원하는 주파수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고소음 환경에서도 기계 고장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계공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 ‘메카니컬 시스템즈 앤 시그널 프로세싱(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에 이번 달 게재됐다. 공장, 발전소, 항공기 엔진룸과 같은 산업 현장은 80~100데시벨(dB)에 달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계가 고장 나기 직전 내는 미세한 ‘이상 신호음’이 거대한 기계 소음에 묻혀버려 작은 균열이나 기계 마모 같은 초기 징후를 놓치기 쉬웠다. 이는 결국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와 막대한 수리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산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음 환경에서 ‘소리’로 기계 고장을 진단하는 기술이 등장했다. 기계가 정상일 때와 고장 났을 때 내는 소리(주파수)가 다른 점에 착안해 고장을 의미하는 특정한 ‘이상 주파수’ 성분만 정확히 분리해 기계 이상을 진단하는 원리가 적용된 방식이다. 따라서 이 기술에는 기계 내외부에 장착된 전자회로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센서 신호에서 특정 주파수를 분리하는 ‘밴드패스 필터’와 복잡한 마이크 배열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방식에는 계산량이 많고,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 고장(다른 주파수)을 진단하기 위해 매번 번거롭게 비싼 회로나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성훈 교수 연구팀은 복잡한 전자식 필터나 다중의 마이크 배열 없이 피리 모양의 세계 최소형 메타구조(직경 4cm·길이 30cm)와 마이크 하나만으로 1.8~22킬로헤르츠(kHz) 대역의 소리를 선별·증폭하는 하드웨어 밴드패스 필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소리를 간섭시키는 구조만으로도 주파수를 걸러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 발상의 구현에 나선 연구진은 실린더 형태의 ‘간섭 원리 기반 메타구조(Interference Structure)’를 고안하고, 그 안에 일정 간격으로 뚫린 여러 개의 슬릿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가 서로를 상쇄·보강하도록 설계했다. 그에 따라 이 밴드패스 필터는 기존의 전자신호 대신 음파의 위상 차이를 이용해 특정 방향의 특정 주파수를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조를 돌려 각도만 바꿔도 어떤 주파수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달라지므로(예: 2kHz → 71°, 5kHz → 20°, 10kHz → 11°) 장치를 물리적으로 회전시켜 원하는 주파수의 소리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고안된 밴드패스 필터는 이전 방식과 달리 새로운 종류의 기계 고장(다른 주파수)을 탐지할 때마다 매번 새 구조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 즉, 다양한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탐지해야 하는 산업 현장에서 범용성이 부족했던 기존 밴드패스의 한계를 극복한, 하드웨어로 작동하는 음향 밴드패스 필터가 구현된 것이다. 연구진은 밴드패스 필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현장 실험에서 공사장 소음, 클럽 음악, 기차 소리와 유사한 크기의 100dB 소음 조건에서도 목표 주파수의 신호 세기가 4.82배 커지는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가공 기계에 적용한 실험에서는 고장을 뜻하는 이상 주파수(2041Hz)가 19.9배 증폭해 새로 개발한 밴드패스 필터의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다. 또 기존의 소리 센서로 취득한 데이터로 훈련시킨 인공지능(AI) 고장 진단 모델은 소음 환경에서의 기계 고장 인식률이 0%에 그쳤으나 음향 밴드패스 필터 센서로 취득한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은 동일한 환경에서 78.6%의 인식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기존에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했던 고장이 앞으로는 정밀하게 진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연구진은 단순한 하드웨어 구조 하나의 기능이 복잡한 전자식 필터나 다중 마이크 배열이 맡던 역할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실증했다. 이번 연구의 밑바탕인 ‘간섭 원리 기반 메타구조’ 설계는 연구진이 이전에 개발한 ‘단일센서 기반 3차원 위치추정(3DAR, 3D Acoustic Ranging)’ 기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안 교수팀은 해당 연구에서도 메타구조를 활용해 마이크 하나와 회전 구조만으로 소리의 위치를 추정하는 혁신적 음향 센서를 구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원리를 한 단계 더 확장해 소리를 ‘듣는’ 걸 넘어 ‘선택적으로 걸러내는’ 단계까지 발전시킨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 기술은 앞으로 스마트 공장, 로봇, 항공기, 풍력 터빈 등 고소음 산업 환경에서 안전 사고의 징후인 주요 이상 신호를 잡아내는 하드웨어로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장 내 CNC나 모터의 이상 소리만 자동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24시간 계속되는 소음 속에서도 센서가 배관 누수나 충돌음을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오직 하드웨어만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없고, 고장 위험이 낮으며, 유지 비용이 적다는 강점도 향후 음향 밴드패스 필터가 폭넓게 응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안성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회로가 계산하기 전에 기계가 먼저 판단하는 지능, 즉 물리적 지식 기반 구조가 정보를 선별·가공해 연산 부담을 줄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지능(Mechano-Intelligence)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논문의 제1저자인 안세민 박사과정생은 “세계 최초로 선보인 하드웨어 음향 필터는 각도만으로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으며, 향후 AI와 결합 시 소음 속에서도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기계의 지능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세민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생은 혁신설계 및 통합생산 연구실에서 인간처럼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인지/판단/행동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다중 로봇의 협업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부가 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RS-2024-00409092)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
- 종합
- 교육
-
서울대 안성훈 교수팀, 전자회로 없이 특정 주파수 증폭 가능한 필터 개발
-
-
서울대 이건도 교수팀 ‘열적 디커플링’으로 고온초전도 현상 매커니즘 규명
- 서울대학교 고온초전도 연구단(단장 이건도 신소재공동연구소 연구교수)이 4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던 고온초전도 현상의 근본 원인을 ‘열적 디커플링(Thermal Decoupl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자 중심 이론으로는 해석되지 않던 여러 실험 결과를 모두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이번 연구는 초전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물리 분야의 국제학술지 ‘머티리얼즈 투데이 피직스(Materials Today Physics, IF=9.7)’에 ‘Thermal Decoupling in High-Tc Cuprate Superconductors’ 제하의 논문으로 지난 10월 27일 온라인 게재됐다. 1911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카멜링 오네스가 발견한 ‘초전도 현상’은 전류가 저항 없이 흐르는 상태다. 이후 1957년 ‘BCS(Bardeen·Cooper·Schrieffer) 이론’을 발표해 초전도 현상의 메커니즘을 밝힌 미국의 물리학자 바딘·쿠퍼·슈리퍼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지만, 이 이론은 섭씨 약 영하 250도(절대온도 약 25K) 이하에서만 성립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86년 IBM취리히연구소의 베드노르츠와 뮐러가 영하 240도에서도 초전도체가 되는 구리산화물(cuprate)을 발견한 뒤 상압·영하 140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발견된다. 따라서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은 ‘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가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오래 매달려왔다. 지난 40년 동안 많은 접근법이 실패한 건 ‘전자’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파악한 서울대 이건도 교수팀은 층상 구조를 가진 고온 초전도체의 열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로 이 난제의 해결에 도전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고온 초전도 물질은 이차원 물질이 적층된 구조며, 각 층이 서로 다른 원소로 이뤄져 층간 결합이 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섭씨 영하 70도(절대 온도 약 200K) 이하일 때 층 사이의 열 흐름이 끊어지는 ‘열 분리(thermal decoupling)’ 현상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초전도가 실제로 일어나는 구리와 산소로 이뤄진 층은 YBCO(Yttrium barium copper oxide, 이트륨 바륨 구리 산화물로 이뤄진 고온 초전도 물질) 내부에 있고 낮은 유효온도를 유지하며 BCS 이론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실험에서 측정되는 값은 바륨과 산소로 이뤄진 표면층의 높은 온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간의 실험 결과가 기존 이론과 불일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효온도 차이를 만든 핵심 요인은 바륨(Ba)과 같은 알칼리 토금속으로, 이들이 층간 이온 결합을 조절하며 열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규명됐다. 아울러 이론적 계산에 따르면 이 ‘온도 분리 효과’를 보정했을 때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던 저항과 온도의 선형관계(linear-T resistivity), 우에무라 관계(Uemura relation), 초전도 돔(superconducting dome), 축소된 동위원소 효과(isotope effect)가 모두 하나의 원리 하에 정량적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고온초전도 메커니즘 규명에 성공한 이번 연구는 반도체 중심의 기존 전자 산업을 뛰어넘는 혁신적 산업, 즉 양자소자, 전력전송, 양자 컴퓨팅, 자기부상, 에너지 저장 기술 등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상온에 근접한 초전도체 개발의 핵심 아이디어를 확보해 관련 특허를 이미 출원했으며, 머신러닝 기반의 고온 초전도 신물질 탐색 연구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이건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열평형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 패러다임으로, 과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플랑크의 양자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곧 ‘열적 디커플링’을 직접 검증하는 실험 결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의 주저자로서 핵심 계산을 수행한 서울대 신소재공동연구소의 이성우 박사는 마법각도 꼬임 이중층 그래핀, 카고메 초전도 물질 등 다른 고온 초전도 물질에서도 ‘열적 디커플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 난제도전과제 및 KISTI 슈퍼컴퓨팅 센터의 거대도전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
- 종합
- 교육
-
서울대 이건도 교수팀 ‘열적 디커플링’으로 고온초전도 현상 매커니즘 규명
-
-
아태이론물리센터 전재형 사무총장, 경북과학기술대상 과학기술진흥 부문 대상 수상
- 아태이론물리센터(소장 사사키 미사오, 이하 APCTP)는 ‘2025 경북과학기술대상’ 과학기술진흥 부문 대상 수상자로 전재형 사무총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북과학기술대상은 과학기술의 육성과 그 문화 확산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상으로, 창의적인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2001년 제정됐다. 수상자는 부문별 성과, 우수성, 그리고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전재형 사무총장은 물리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2021년 APCTP 사무총장으로 부임해 △정부 공공사업 우수 운영을 통한 지역 과학행정 위상 제고 △APEC 기반 국제협력 확대 및 과학외교 실현 △과학문화 대중화 및 지역 인재 양성 기반 확립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5 경북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경북과학축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과학축전은 경상북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과학문화 축제로 다양한 전시·체험·강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APCTP는 경북과학축전과 연계해 경북도민들을 대상으로 ‘APCTP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강연’을 양일간 진행 예정이다. APCTP 사사키 미사오 소장은 “센터는 국내외 연구 활동과 국제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는 것 같다. 앞으로도 센터는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북도민을 위한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PCTP는 199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내 유일의 국제이론물리센터다. 현재 아태 지역 19개 회원국 및 36개 협력·협정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여 명의 국내외 과학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해 왔다.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연구 협력 확대를 이어가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론물리 및 기초과학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발히 촉진하고 있다. 또한 대중강연, 지역 과학축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시민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과학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있다.
-
- 종합
- 교육
-
아태이론물리센터 전재형 사무총장, 경북과학기술대상 과학기술진흥 부문 대상 수상
-
-
서울대 권성훈 교수팀, 신속 무균 시험법 개발 성공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서울공대)은 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과 이은주 교수,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김태현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기존에는 14일이 걸리던 의약품 무균 검사를 단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는 ‘신속 무균 시험법(NEST, Nanoparticle-based Enrichment and rapid Sterility Test)’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게재됐다. 대한약전에 따른 무균시험법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균이 없어야 하는 제품이 실제로 무균 상태인지 확인하는 시험법으로, 일반적으로 14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최근 제약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의 바이오의약품에도 이와 동일한 확인 시험법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은 현대 생명공학의 산물로, 난치 혈액암 환자를 완치시킨 CAR-T 세포치료제, 팬데믹의 흐름을 바꾼 코로나19 mRNA 백신, 그리고 암 면역치료의 핵심 무기가 된 단일클론항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약품들은 불치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암을 완치시키고 치료 기회가 없던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연 바 있다. 이처럼 미래 의료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4000억달러(약 55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매년 약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빠른 시장 성장 및 기술 진보와는 대조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과거 합성의약품의 기준을 답습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 기준은 유효 기간이 수일에 불과한 최신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를 낳는다. 바이오의약품의 무균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약효는 사라지고 환자는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의약품의 무균 입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투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했던 한계였다.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선 공동 연구진은 기존 검사에 소요됐던 14일의 기간을 단 하루 이내로 단축한 신속 무균 검사 기술인 NEST를 개발했다. 환자에게 무균이 입증된 바이오의약품을 제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연구진은 우리 몸의 선천 면역 반응(침입균을 구별하는 방어 체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다양한 병원균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특수 펩타이드 코팅 자성 나노입자를 활용해 의약품 내 극미량의 병원균을 신속히 농축했다. 이어 광범위한 미생물의 대사 신호를 실시간으로 고감도 형광 검출할 수 있는 전용 이미징 칩과 자동화 장비를 개발해 기존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와 높은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8시간 이내에, 14가지 균종에서 극미량의 균(1ml당 하나의 균체)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공동 연구진은 임상 등급의 줄기세포와 1회 투여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CAR-T 세포치료제 등 실제 투여용 샘플을 활용해 검증을 수행했고, 그 결과 NEST가 실험실 단계를 넘어 실제 환자 시료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과 이은주 교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제조 직후 환자에게 즉시 투여되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완제에 대한 14일 무균 검증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완제에 대해서도 당일 무균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된다면, 관련 규제 체계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이며 환자 안전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훈 교수가 대표로 있는 종합 미생물 진단 기업 퀀타매트릭스와 서울대학교병원은 NEST의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 8월 신속 무균 검증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규모 임상 검증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용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자체 생산·운영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제 환자 시료 기반 평가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퀀타매트릭스는 서울대·고려대·서울대병원 연구진과 ‘uRAST(세계 최초로 배양 없이 13시간 이내 항생제 감수성·병원체 동정, 2024년 Nature 게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 미생물 진단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NEST의 장비·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적용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올해 안에 서울대병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 내에 장비 2대를 설치하고, 실제 임상 시료로 성능 평가와 기술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바이오의약품을 넘어 패혈증 진단, 식품 안전성 검사, 화장품 무균성 검증, 감염병 확산 초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 김태현 교수는 “NEST는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여러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임상 현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신뢰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ᅠ 서울대 권성훈 교수는 “이번 성과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가 검증과 임상 적용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향후 국내를 넘어 글로벌 임상과 규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ᅠ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강준원 박사는 2025년 2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혈액 배양 단계를 생략한 패혈증 진단 플랫폼과 의약품의 신속 무균 입증 플랫폼 등 혁신적인 균 검출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산업체 및 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해당 기술들의 임상 적용성과 산업적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하는 동시에 신생아 패혈증 진단 및 환경 모니터링, 폐렴 모사 시스템 등 감염성 질환의 진단 및 관리 분야로 연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
- 종합
- 교육
-
서울대 권성훈 교수팀, 신속 무균 시험법 개발 성공
실시간 교육 기사
-
-
칼빈대 비전선포식 갖고 강소대학 도약 및 글로벌화 추진 선언
- 칼빈대학교(총장 황건영 박사)는 지난 5일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강당에 모인 임경만 이사장과 황건영 총장 및 교수, 직원, 학생들은 비전선언문을 통해 고도성장의 조건들이 사라지고 디지털 혁명, 초고령 저성장 사회, 양극화, 환경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칼빈대학교가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해 명문 강소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칼빈대학교는 대위임령(마 23:19-20)의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시대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과 위상을 높여 2024년을 국제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글로벌 칼빈’의 원년이 되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명예이사장 김진웅 목사는 학생들이 칼빈대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큰 뜻을 발견하며 성장하길 기원했다.
-
- 종합
- 교육
-
칼빈대 비전선포식 갖고 강소대학 도약 및 글로벌화 추진 선언
-
-
"하나님 나라 확장 앞장설 것"...성결대 정상운 명예총장 추대
-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은 지난 23일 제8회 성결신학원 이사회에서 정상운(사진) 전 교수를 성결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정 명예총장은 1987년 신학과 교수로 임용돼 지난 2월 정년 퇴임했다. 재직 기간 중 성결대 5, 6대 총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성결교회 백년사', '한국성결교회와 사중복음' 등 45권(공저 포함)이 있다. 현재 대학총장포럼 회장과 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 한국신학회 회장, 대한민국기독교원로의회 공동회장 등을 맡아 한국교회 발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
- 종합
- 교육
-
"하나님 나라 확장 앞장설 것"...성결대 정상운 명예총장 추대
-
-
SMIT 한희 총장, AI 시대 혁신 선도 비전 제시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 SMIT)는 지난 23일 한희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한희 총장은 한국국방연구원 전자통신연구실장, 국군 정보사 여단장, 국방부 장관 과학보좌관, 모토로라 해외유치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인사다. 독일 10개 대학과 공동으로 SMIT의 전신인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설계하고 SMIT 정교수로 10년간 근무한 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년 퇴임했다. 국방부, 합참, 육군, 사이버사, 교육사 등의 정책자문위원직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이사회 이사로 봉사해 왔다. 한희 총장은 취임사에서 SMIT가 인공지능(AI) 시대 강소대학의 민첩함과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을 선도해 갈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AI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전 대학 차원의 인재 핵심 역량으로 수용하고, AI/XR 기반 메타버스 공간에서 글로벌 시장 교육 경쟁력을 갖춰 건학 이념에 따라 시장 가치를 설계·실험하는 교육으로 공헌하는 포부를 밝혔다. SMIT는 마곡과 상암DMC에 캠퍼스를 두고 실무 중심 융합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 디지털 뉴미디어 특성화 대학으로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응용소프트웨어학과, 미디어비즈니스학과, 융합예술디자인학과의 공학, 인문사회, 예술 계열의 학과가 서로 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AI, 빅데이터, 증강 현실(AR)·가상 현실(VR), 사물 인터넷, 로봇, HCI, 메타버스 등과 관련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는 비즈니스 역량을 기반으로 예술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이 조화를 이룬 미디어 산업의 전문 융합 인력 육성을 목표로 2009년 3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개교한 미디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이다. 미디어 디자인, 미디어 제작에 중점을 두고 경영, IT의 실용적인 융합 학문을 추구하는 석사학위과정 대학원이다.
-
- 종합
- 교육
-
SMIT 한희 총장, AI 시대 혁신 선도 비전 제시
-
-
칼빈대 황건영 총장 “사명에 맞는 멋진 삶 살아가길”
- 칼빈대학교(총장 황건영 박사)는 20일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고 2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서 김경임, 신유진, PHUNG THI HANG 씨가 성적최우수상(총장상)을 받았고, 김창성, 마의환, 최민규, 김가은, 유미숙, LAMA CHANDA 씨가 우등상(총장상)을 받았으며, 졸업논문우수상(총장상)은 유미숙 씨가 받았다. 이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공로상(이사장상) 김선교 △총동문회장상 김성령, 서경수 △대학동문회장상 강원진 △신대원동문회장상 박선영. 이날 이선희, 조문래, 진지성 씨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김삼열 교수(교목실장)의 사회로 시작됐고, 나기철 목사(이사)의 기도 및 김지호 교수(국제목회대학원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가 말씀을 전했다. 황건영 총장은 훈시를 통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황 총장은 “내 삶을 이끈 키워드는 에벤에셀”이라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부르신 사명에 맞는 멋진 삶을 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경만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졸업한 학생들을 축하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타 대학의 총장들도 학위수여식에 함께 해 축사와 격려사를 하며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최대해 총장(대신대학교)은 “교정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을 하나님과 이 나라 및 인류를 위해 사용하며 진실되게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역경에 처할 수 있지만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다. 졸업생들이 지식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월을 아끼며 전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축사한 정규남 박사(광신대 전 총장)는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삶이 될 것”이라며 “길이 막힐 것 같을 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승환 교수와 이아네스 교수는 축가를 하며 졸업생들을 축복했고 학위수여식은 김진웅 박사(명예이사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한편 김진웅 이사장은 졸업생들에게 “디오게네스는 사람다운 사람이란 돈으로 살 수 없고 일구이언하지 않는자, 작은 일도 크게 생각하는 자, 승리하고 자만하지 않으며 실패하고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자, 일은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며 성공과 실패를 인정하는 자라고 했다”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행하며 삶 속에서 은혜가 더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
- 종합
- 교육
-
칼빈대 황건영 총장 “사명에 맞는 멋진 삶 살아가길”
-
-
서울대 고승환 교수팀, 전력 소비 없이 냉각과 가열 가능한 소개 개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기계공학부 고승환 교수팀이 전력 소비 없이 단일 소재만으로 냉각과 가열이 모두 가능한 혁신적인 에너지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대란, 찜통 차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촉발하고 있어 온도 제어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소모 없이 냉각이 가능한 ‘수동복사냉각’ 기술에 대한 국내·외 연구진들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수동복사냉각 기술은 물체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반사하고 자발적으로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는 ‘플랭크 법칙’을 이용해 열을 우주로 방출해 냉각 효과를 내는 기술이다. 이는 물체의 태양광 반사율이나 적외선 방사율과 같은 고유한 광학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 없이 냉각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여겨진다.하지만 기존의 수동복사냉각은 물체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의 구현 원리상 냉각이 필요 없는 겨울철에도 냉각 효과를 보여 사계절 적용이 어렵다는 효율성 측면의 한계가 있었다.그간 국내·외 유수의 연구진들이 물체의 광학적 특성을 제어해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했지만, 단일 소재 내에서 냉각과 가열이 동시에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하는 온도 제어기술 구현에는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고승환 교수팀은 “탄성체 고분자 물질과 전기방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사냉각과 가열이 모두 가능한 마이크로-나노 스케일 섬유 기반의 필름을 제작했다”며 “제작된 섬유 기반의 필름은 압력에 의해 섬유 구조가 변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광학적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구팀이 개발한 소재는 섬유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태양광 반사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 산란(Mie scattering)’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냉각 모드에서는 태양광을 93% 반사하고, 가열 모드일 때는 태양광을 약 10% 반사하며 자유자재로 광학 특성을 변화시켰다.연구팀은 단순히 압력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여름철에는 냉각 효과가, 겨울철에는 가열 효과가 나타나며 냉각과 가열의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외부 기상조건에 따라 온도 제어에 효과적인 광학 특성을 갖도록 구조를 제어한 결과, 마치 에어컨처럼 설정한 온도를 빠른 속도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입증했다.또한 연구팀이 개발한 필름은 태양광을 모사한 램프의 세기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자유로운 광학 특성 제어를 통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기존 복사냉각 및 가열 기술 대비 한층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승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일 소재로 연속적인 온도 변화를 확인한 세계 최초의 실험 사례로,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냉·난방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상용화되면 새로운 온도 제어 솔루션을 활용해 제로에너지빌딩을 통한 탄소 중립,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모량 개선, 스마트 팜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
- 종합
- 교육
-
서울대 고승환 교수팀, 전력 소비 없이 냉각과 가열 가능한 소개 개발
-
-
서울대 공대, 서울대학교기술지주와 SNU공학기술유니콘발굴투자조합 2호 조기 결성 위해 협약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서울대학교기술지주와 공동으로 ‘SNU공학기술유니콘발굴투자조합 2호’ 조기 결성을 위한 협약을 지난 22일 맺었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대와 서울대기술지주는 2022년 6월 서울대 공대 동문 37인을 중심으로 모은 자금 53억원을 서울대 공대 기술 기반의 유망 벤처에 투자하는 ‘SNU공학기술유니콘발굴투자조합 1호’ 펀드를 결성해 성공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다.해당 펀드는 국내 최초로 펀드 수익금의 일부를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기부형 벤처투자 펀드다. 이에 양 기관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서울공대 최우수 인재가 설립하는 테크 스타트업 투자에 임하고 있다.그 결과 조만간 기업 공개를 앞둔 ‘설로인’을 포함한 7개 유망 기업에 이미 10억원을 투자했으며, 2025년까지 전액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서울대 공대는 국내 최고의 기술 인재와 기술 창업 지원 시스템 결합을 통해 테크 기반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서울대기술지주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GP)으로서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 심사와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1호 투자조합이 그간 성과를 보임에 따라 학내에 2호 투자조합의 조기 결성에 대한 높은 요구가 이어졌으며, 이에 이번 2호 투자조합 결성 협약식이 진행됐다.서울대 공대 홍유석 학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2022년 1호 투자조합 때만 해도 학내의 인식과 홍보가 미흡해 졸업생 동문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았으나, 1호 투자조합의 성공적 운영으로 학내에서 ‘2호 투자조합은 언제 만드냐’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래는 1~2년 후로 계획한 2호 펀드 결성을 조기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투자 수익 상당 부분이 서울대 공대 발전기금으로 기부돼 인재 양성을 통해 공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며 협약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서울대기술지주 목승환 대표는 “지난 1년 6개월간 서울대 공대와 협력해 1호 투자조합을 운영해보니, 서울대 공대 창업 지원 시스템이 발굴한 유망 초기 스타트업 기반이 매우 뛰어나 투자 기업 발굴 과정이 매우 효율적이었고, 2호 투자조합을 조기에 만들어도 좋겠다는 확신이 강해졌다”며 “그동안 서울대기술지주의 투자 역량도 더 강화된 만큼 서울대 공대의 우수 인재가 결합돼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고, 이를 통해 공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종합
- 교육
-
서울대 공대, 서울대학교기술지주와 SNU공학기술유니콘발굴투자조합 2호 조기 결성 위해 협약
-
-
서울대 고승환 교수팀, 야누스 구조 웨어러블 열전 전자 피부 개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기계공학부 고승환 교수팀이 야외 환경에서 태양 빛의 세기에 따라 지속적인 자가 전력 생산이 가능한 야누스(Janus) 구조의 전자 피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워치, 헬스 밴드, 스마트 의류 등의 웨어러블 기기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건강, 생활, 업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런 기기들의 꾸준한 사용에는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 현재 웨어러블 기기는 주로 단단하고 부피가 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가벼움과 편의성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터리의 짧은 충전 주기 및 용량 한계와 같은 기술적 어려움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외 유수 연구진들은 새로운 지속 가능한 전력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중 체온을 이용해 자가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웨어러블 열전 소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열전 소자는 열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소자로, 제벡 효과에 따라 체온과 주변 환경 간 온도 차이를 이용해 배터리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웨어러블 열전 소자는 야외에서 사용 시 태양 빛에 따른 기기 성능 저하로 꾸준한 전력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고승환 교수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야누스 구조를 활용한 신축성 있고 부드러운 웨어러블 열전 전자 피부를 개발했다. 야누스 구조는 상층부와 하층부 기판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구조로, 태양 빛의 세기에 따라 소자를 뒤집어가며 체온과 주변 환경 간 온도 차이를 극대화해 최적의 전기 에너지를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고승환 교수팀은 복사 냉각 및 태양광 흡수-가열 현상에 착안,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냉각 섬유와 가열 섬유를 개발했다. 또 해당 섬유를 신축성과 통기성이 있는 다공성 구조로 설계해 착용 시 피부에서 땀 배출이 쉽게 해 오랫동안 착용해도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야누스 구조 전자 피부를 통해 태양 빛의 세기가 약한 상황(오전 혹은 늦은 오후 시간대)에서는 냉각 기능으로 피부(고온)-소자(저온) 환경을 조성했고, 태양 빛의 세기가 강한 상황(정오 부근)에서는 가열 기능을 통해 피부(저온)-소자(고온) 환경을 조성해 외부 환경에 따라 온도 구배를 극대화함으로써 최적의 자가 전력 생산 성능을 구현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고승환 교수팀은 실제 야외 환경에서 태양 빛의 세기가 약한 오전에는 복사 냉각 모드로 사용했을 때 태양광 흡수-가열 모드보다 대략 5.65배 정도 우수한 전력을 생산했고, 태양 빛의 세기가 강한 정오 부근에는 태양광 흡수-가열 모드에서 2.48배 정도 우수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 고승환 교수는 “이번 성과는 지속적인 웨어러블 기기의 운용을 위한 차세대 소프트 자가 전력 생산 기술에 걸맞은 연구로, 이 기술이 앞으로 운동선수나 야외 작업자의 지속적인 생체 신호 모니터링을 비롯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귀중한 자산과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리고 옷 한 벌로 여름과 겨울과 같은 다양한 날씨에도 지속적인 자가 전력 생산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의복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응용 물리학 및 재료과학 분야 저명 학술지 ‘Small’ 저널에 2024년 1월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 제목은 High Efficiency Breathable Thermoelectric Skin Using Multimode Radiative Cooling/Solar Heating Assisted Large Thermal Gradient 다.
-
- 종합
- 교육
-
서울대 고승환 교수팀, 야누스 구조 웨어러블 열전 전자 피부 개발
-
-
서울대 선박유탄성연구센터와 HD현대중공업, 슬로싱 기술 고도화 위해 협력
- 서울대학교 선박유탄성연구센터와 HD현대중공업이 19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 글로벌 R&D 센터에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대학교 로이드기금 선박유탄성연구센터(LRFC) 김용환 센터장과 HD현대중공업 이현호 선박해양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상호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친환경 액화 화물 및 연료를 저장하는 화물창 개발을 위한 슬로싱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최근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 규정 강화에 따라 LNG뿐 아니라 액화 암모니아, 액화 수소 등과 같은 화물이나 연료들은 액체 상태로 저장되고 이송돼야 한다.해상을 운항하면서 겪게 되는 선박의 움직임에 의해 선박 내부의 액체 화물이 동요하는 현상을 슬로싱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극심한 충격 하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충격 하중은 탱크 구조에 치명적인 구조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 액체 화물창 개발에서 슬로싱 충격 하중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서울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슬로싱 모형실험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 FSRU, FLNG, LNG 이중연료 추진선, 벙커링 선박 등 다양한 선박의 화물창 설계를 위한 슬로싱 연구들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관련 국제 표준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서울대의 연구와 실험을 지원한다.HD현대중공업 이현호 선박해양연구소장은 “다양한 연구 경험과 국제적 전문성을 가진 서울대학교 선박유탄성연구센터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 및 무탄소 화물-연료 화물창의 기술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운송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종합
- 교육
-
서울대 선박유탄성연구센터와 HD현대중공업, 슬로싱 기술 고도화 위해 협력
-
-
서울대 인공지능 대학원과 현대엔지비, 인재 양성 위해 맞손
- 서울대학교(SNU) 대학원 인공지능 전공(IPAI, Program i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인공지능 대학원)과 현대엔지비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 AI·SW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고 수준의 AI·SW 실무 인재 양성’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AI·SW 인재 육성 솔루션 도출, 인증 평가 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교육 인력 및 자원을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은 세계적인 AI 교육 연구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내 흩어져 있던 AI 관련 교수들의 역량을 한 거점으로 모아 교육과 연구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현대엔지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AI 기술 내재화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하기 위한 AI·SW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역량을 평가 및 검증하는 HDAT (Hyundai Motor Group Data Analytics Test), HSAT (Hyundai Motor Group Software Aptitude Test) 자격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 전문 교수진이 HDAT 인증 평가의 출제 및 평가에 직접 참여, HDAT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게 된다. 특히 컨설팅부터 운영 전반을 20년 넘게 수행한 현대엔지비의 ‘HRD BPO(HRD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험’과 세계적인 수준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Core AI부터 X+AI 전반을 다루며 8개 대학 21개 학부 68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의 ‘AI 전문성’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인공지능대학원 강유 주임 교수는 “현대엔지비의 HDAT 인증 평가는 AI·SW 분야에 필요한 선도적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퀄리티 높은 인증 평가로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HDAT 인증 평가와 연계된 AI·SW 인재 육성 프로그램들도 확대돼 운영될 예정이다. 민간 자격으로 등록돼 있는 HDAT는 국내 다른 인증 평가와는 차별화돼 있다. 먼저, 평가 응시 중에도 스스로 본인의 분석 수준을 확인하며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형 평가라는 응시 방법 차원의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 특장점으로는 AI를 처음 접한 실무자가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을 현업에 적용, 성과를 낸 사례들을 직접 겪으며 쌓은 현대엔지비의 노하우에 있다. 실무 현장에서 AI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출제 범위에 반영돼 있어 HDAT 인증을 받은 사람은 현업에 AI를 적용해 성과를 낼 수 있음이 증명된다. 한편 HDAT 인증 평가는 총 2개의 시험과 4단계의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 HDAT-DA 시험을 통해 Lv 1 또는 Lv2를 취득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 초급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HDAT-DS 시험을 통해 Lv 3 또는 Lv4를 취득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 중급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현대엔지비는 2022년부터 운영해온 HDAT 자격 인증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AI·SW 기저 역량 수준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육성할 수 있는HRD 토털 솔루션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
- 종합
- 교육
-
서울대 인공지능 대학원과 현대엔지비, 인재 양성 위해 맞손
-
-
서울대 연구팀, 빛의 주파수 변조할 수 있는 3차원 위상학적 펌프 2차원 평면상에 구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전기정보공학부 유선규 교수, 박남규 교수 연구팀이 빛의 주파수를 변조할 수 있는 3차원 위상학적 펌프(pump)를 2차원 평면상에 구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주파수 공간을 가상의 합성차원(synthetic dimension)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3차원 입체에서의 물리 현상을 2차원 평면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Shanhui Fan 교수와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달성됐으며, 물리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Physical Review Letters에 1월 17일 게재됐다.현재 반도체 및 광소자 제작 기술은 기본적으로 2차원 구조 및 이들의 적층을 활용한다. 이 경우 실린더, 다면체 등과 같은 3차원 구조가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설계 자유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또는 빛 등의 신호를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최근 과학계에서는 해당 한계 돌파를 위해 공간 차원을 다른 물리량으로 치환하는 합성차원(Synthetic Dimension)의 개념이 제안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간 정보를 소자가 갖는 고유 주파수 정보에 대응시켜 새롭게 차원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법을 통해 3차원 또는 그보다 높은 차원의 물리 현상을 제작이 쉬운 2차원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유선규 교수와 박남규 교수 연구팀은 합성차원의 개념을 도입해 199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러플린(Robert Laughlin)이 제안한 3차원 실린더 구조의 ‘위상학적 펌프’를 2차원 광집적회로 시스템에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소자는 위상물리학(Topological Physics)적 성질을 활용, 소자 제작 시 공정 오차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갖는다. 이는 수십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의 오차에도 민감한 광학 소자 구현 시 큰 이점이다.연구팀은 집적회로 구현이 쉬운 2차원상 빛의 흐름을 3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 빛의 주파수 축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빛이 흐르는 매질을 시공간상에서 변화시켰으며, 이 경우 빛이 마치 3차원 실린더 상에서 흐르듯이 구현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또 해당 시공간 변화가 빛이 가상의 자기장을 느끼게 함으로써, 러플린이 제안한 펌프의 위상학적 특성도 함께 구현했다.논문 제1저자인 김지성 학생은 “이전에 극저온 원자 시스템에서 러플린 펌프가 구현된 바 있으나, 상온 동작 및 확장성이 있는 구현 사례는 전무했다”며 “또 주파수 합성차원을 활용함으로써 관찰이 어려운 고차원 위상학적 현상을 저차원에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의의를 밝혔다.논문의 공동 교신저자인 유선규 교수와 박남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빛의 색(즉, 주파수)을 매우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으며, 해당 특성은 위상학적으로 보호되는 광자 메모리 및 광자 컴퓨팅 소자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연구는 학부생 연구원인 김지성 학생(제1저자: 현재 버클리대학교 박사 과정)과 김경훈 학생이 주도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실 사업(BRL, 전자-광자 하이브리드 기반 멤리스틱 소자 기초연구실), 중견 연구자 및 우수신진연구 사업과 서울대학교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됐다.
-
- 종합
- 교육
-
서울대 연구팀, 빛의 주파수 변조할 수 있는 3차원 위상학적 펌프 2차원 평면상에 구현